[한스경제=이성노 기자]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ㆍ일과 생활의 균형)은 먹는건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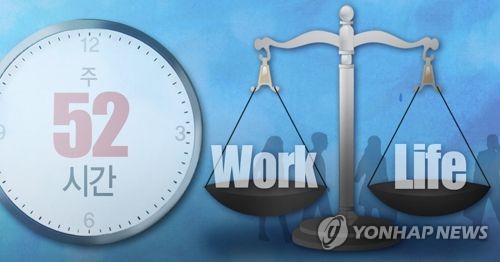
모 기업 인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A씨의 푸념 섞인 한마디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며 모두가 '워라밸'을 외치고 있지만, A씨에게는 예외다.
8일,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지 100일을 맞았다. 정부는 지난 7월1일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하루 최대 8시간에 휴일을 포함한 연장근로를 총 12시간까지만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단. 시행 초기 혼란을 감안해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구인구직 매칠플랫폼 '사람인'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법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에 재직중인 회사원 가운데 33.5%는 실제 근로시간이 줄었다고 답했다. 워라밸의 지표가 되는 야근에도 변화가 있었다. 응답자 37.8%는 야근이 줄었다고 답했다. 35.3%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여가활동 시간이 늘어난 응답자도 36.3%로 나타났다.
하지만 A씨에게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A씨 회사는 오전 9시 출근, 6시 퇴근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보통 7시30분까지 출근하고 빨라야 오후 8시가 넘어야 사무실을 나올 수 있다.
대부분 부서엔 퇴근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컴퓨터가 꺼지는 PC오프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A씨가 속한 인사팀은 제외다. 조기 출근은 물론 야근은 일상이 됐고, 채용이 한창인 최근에는 수당없는 주말 근무도 불사하고 있다. '워라밸'은 그야말로 '남의 나라 이야기'인 셈이다.
A씨는 "업무시간은 단축됐지만, 근본적인 일의 양은 줄지 않았다"며 "인력이 충원되지 않는 이상 시간외 근무는 필수다"고 푸념했다. 이어서 "특히 채용 기간엔 오후 10시가 넘어야 근무가 끝난다"면서 "사내에선 인사팀은 단축 근무제에서 예외라는 인식도 강하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업무량도 문제지만, 조직 분위기나 문화도 주52시간 근무제 안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모양새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B씨는 부서 특성상 타부서와 프로젝트팀을 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기간에 초과 근무는 필수적이다. 내부적으로 탄력근무제를 이용하면 된다고는 하지만 쉽지 않다.
D씨 회사는 탄력근무제를 부서 단위로 신청하기 때문이다. 한 명 때문에 팀 전체가 탄력근무제를 신청하는 전례가 없을 뿐더러 상사의 눈치가 보인다는 것이다.
D씨는 "제도는 있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직원은 없다고 봐야한다"며 "아직까지 52시간 근무제와 이에 따른 제도들이 회사에 녹아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내부적으로 야근을 하지말라고 하지만, 업무가 많은 사람들은 새벽부터 회사에 나가 일을 하고 있다"며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지 3개월이 지났지만, 조직 문화나 분위기는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사람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절반 이상인 54%는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이후 '별다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근로시간 단축법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한 조건으로는 '강력한 법적 제재(30.7%), '조직 내 분위기(27.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모두가 그리는 워라밸. 주 52시간 근무제가 제대로 안착되기 위해선 채용 확대는 물론 강력한 법적 제재 그리고 암묵적으로 추가 근무 분위기를 조장하지 않는 조직 문화가 제대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이성노 기자 sungro51@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