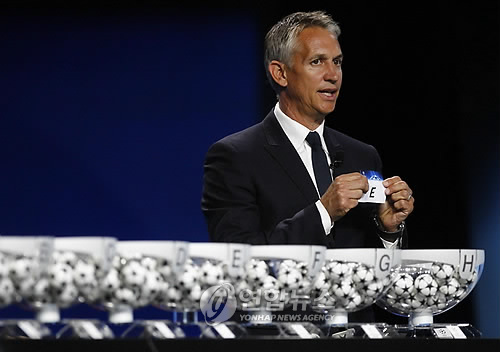
[한국스포츠경제=김준희 수습기자] 지난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F조 조별리그 1차전 잉글랜드와 아일랜드의 경기. 당시 잉글랜드를 대표하는 공격수였던 개리 리네커(59)는 경기 도중 생리 현상을 참지 못하고 바지에 '큰 실수'를 저질렀다. 그렇다면 선수들은 경기 도중 '화장실 신호'가 오면 무조건 참아야 할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다녀올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갔다 오는 대신 페널티가 부과될까?
우선 리네커의 경우를 다시 살펴 보자. 26일(이하 한국 시각) 잉글랜드 매체 데일리메일은 팟캐스트 ’매치 오브 더 데이‘에 출연한 리네커의 이야기를 인용해 ’대변 사건‘을 재조명했다. 리네커는 당시 상황에 대해 “경기가 시작하고 처음은 괜찮았다. 그러나 20분쯤부터 복통이 시작됐다”며 “가까스로 전반을 끝낸 뒤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만, 후반 15분부터 다시 배가 아프기 시작했다”고 위기의 순간을 떠올렸다. 이어 “아일랜드가 공격하는 상황에서 태클을 했다. 주저앉은 순간, 일이 벌어졌다”며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 그날 어두운 남색 바지를 입은 것에 감사하며 잔디를 팠다”고 당시 참혹했던(?) 광경을 묘사했다.
리네커는 일을 저지르고 나서 교체된 후에도 화장실로 갈 수 없었다. 당시 경기장 구조상 드레싱룸과 이어지는 터널이 벤치 반대편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동료들에게 미안함을 느꼈다”며 모두가 저로부터 멀리 떨어져 앉으려 했다“고 기억을 되새겼다.
이처럼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에게 생리 현상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 심지어 경기장에는 많은 관중이 오롯이 선수들의 움직임 하나 하나를 주시하고 있다. 만약 당신이 축구선수고 참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신호가 느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리네커처럼 억지로 참고 뛸 필요가 없다. 신호가 오면, 심판에게 이야기를 한 뒤 화장실에 다녀오면 된다.
김종혁 대한축구협회(KFA) 심판운영팀장은 본지와 전화 통화에서 "경기 도중 생리 현상과 관련된 명확한 규정은 없다"며 “만약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심판한테 이야기를 한 뒤 나가면 된다"고 해당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나갈 때도 심판에게 이야기를 하고, 들어올 때도 심판에게 이야기를 하고 들어와야 한다"며 "그 부분만 잘 지켜진다면 경기 외적으로 경고를 받거나 페널티를 부과받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김 팀장 또한 리네커의 당시 사건을 알고 있었다. 그는 "아무래도 당시에는 그 부분과 관련한 뚜렷한 경기 규칙이 없었던 것 같다"며 웃었다. 또한 "다만 그 상황은 경고를 받을 수도 있다"며 "'경고성 파울' 항목에 보면, '경기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지 않았을 때 경고를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그 행위를 관중이나 동료 선수들이 봤을 때 좋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하면 경고를 줄 수 있다"고 답했다.
해외에선 리네커 외에도 '이런' 사례가 종종 있었다.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골키퍼 잔루이지 부폰(42)은 유벤투스 소속으로 리그 경기를 치르는 도중 배에 신호가 왔음을 강력하게 어필하며 교체를 요청했다. 우루과이 주전 공격수 루이스 수아레스(33)도 A매치 경기에서 화장실을 다녀오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그라운드로 복귀한 경험이 있다.

김준희 수습기자 kjun@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