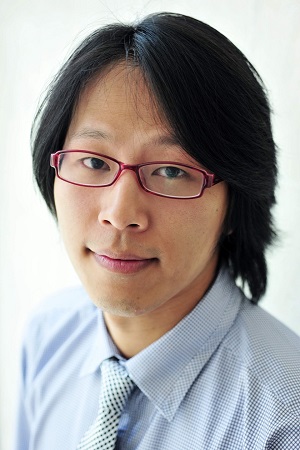
[한스경제=박종훈 기자] 골이 지끈거리고 속이 울렁대도, 매일 쓰디쓴 후회를 곱씹어도 인간이란 존재는 좀처럼 술의 유혹을 떨치기 어렵다. 체질에 따라 전혀 알코올이 받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술에 대한 탐닉은 유사 이래 길고 깊다.
경제학 차원에서 말하자면 술은 대표적인 비가치재(demerit goods)이다. 숙취에 고생이라면 ‘demerit’라는 표현이 너무나 절묘할 것이라 본다. 재화나 서비스 가운데 어떤 것들은 그것을 소비함으로써 얻어지는 효용이나 ‘쾌락’은 과대평가돼 있는 데 반해, 소비로 인한 비효용이나 ‘고통’은 과소평가돼 있는 것을 가리킨다. 술·담배 같은 것 외에도 일부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도박 같은 게 대표적인 비가치재다.
재미있는 것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의 DNA 속에 말 안듣는 청개구리와 같은 양서류의 뭐시기가 섞여 있는지, 사람들은 하라는 건 하기 싫고, 하지 말라고 하면 더욱 하고 싶은가 보다.
앞서 말한 비가치재와 달리, 가치재는 바람직한 양보다 적게 소비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문명화된 국가에선 이를 공공적으로 권장하는 경향이 있다. 의무교육 같은 게 그럴 테고, 의료(공적의료)나 보건, 운동 같은 게 대표적이다.
비가치재는 공권력을 동원해 처막아도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주령, 혹은 금주법이 시행되었다고 생각해 보자.
21세기 한국에서 과연 그런 게 가능할까 싶겠지만, 20세기 미국에선 실제 이와 같은 규제가 발동했다. 3.1운동이 일어나기 두 달 전인 1919년 1월 미국 의회는 주류 판매 및 양조 금지를 골자로 한 수정헌법을 마련했다. 이듬 해에는 이게 정식으로 발효돼 시행됐다.
당시에 가장 큰 명분은 1차 세계대전 중 필요한 식량을 확보하고 뭐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설득력이 부족한 얘기다. 왜냐하면 잉여 식량이 꽤 부족한 시기에도 사람들은 곧잘 술을 빚어 마셨기 때문이다. 우리네 조상님들도 그러고 한심스레 살았기 때문에 익숙한 얘기다.
아무튼 아까 청개구리 DNA로 돌아가서, 하지 말라고 그걸 굳이 ‘법’으로 막아 놓으면 더더욱 하고 싶은 법이다. 대체 비가치재들은 왜 그렇게 하고 싶은 걸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장사 거리가 될 수 있음을 잽싸게 눈치챈 암흑가에선 그야말로 떼돈을 벌었고, 결국 조직적인 범죄를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원천이 됐다. 유명한 미국 ‘마피아’의 전성기가 시작된 것이다.
조직폭력배들 이야기를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 마무리하고, 아무튼 이 얼토당토 않은 규제는 결국 대공황을 맞아 유명무실해졌다.
완전히 같은 건 아니지만 묘하게 최근 상황과 기시감이 드는 이야기일텐데, 다름 아니라 코로나19 상황 중 식당·술집을 포함한 서비스업종과 관련한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었던 2020년에도 우리나라 전체에서 판매된 술은 출고가 기준 8조 8000억원이었다. 주당들이라면 짐작하겠지만, 물론 이 중 소주와 맥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81.8%다.
말인즉, 먹을 사람들은 먹었고 공연히 자영업자들만 피를 보게 만들었던 슬픈 상황이었단 얘기다. 한국 사회의 자영업자 비중은 2022년 기준 23.5% 가량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OECD 평균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게 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폭력적인 ‘방역’ 조치 못지 않게 한국 사회의 경제 규제는 매우 촘촘하고, 정서를 자극한다. 마치 이와 같은 규제가 다수 민중을 위하는 것처럼 그럴싸하게 포장된다.
익히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규제 끝판왕은 금융산업이다. 심지어 금융산업은 규제도 모자라 당국이 인사권에 개입하고, ‘삥도 뜯어’ 간다.
금주법의 초라한 말로가 어땠는지 다시 언급해보자. 물론 시장은 만능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시장을 ‘계획’하려고 시도했던 사회체제가 어떤 말로를 밟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금주법이 대공황 땜에 순삭됐던 것처럼 말이다. 지금의 우리 사회는 어쩌면 경제적으로는 그때와 같은 위기 상황은 아닐지 몰라도, 앞으로 더 큰 해일과 같은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는 불길한 느낌도 든다. 그래서 자고로 만사불여튼튼이라고 했다.
박종훈 기자 plisilla@sporbiz.co.kr


